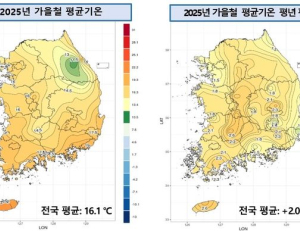『국정기획위원회에 바란다』 정책제안 5회
기술 리스크는 곧 국가 리스크다
신기술 도입보다 더 중요한 건 통제 프레임이다
대한민국, ‘기술 리스크’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기술, 드론, 우주항공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신기술들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늘 새로운 위기를 동반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차별, 디지털 격차, 생명윤리 침해, 기술 독점… 우리는 과연 이런 위험요소를 제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아직 ‘기술 낙관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혁신은 빠르게 추진되지만, 통제 장치는 느리고 뒤늦습니다. 선(先)도입, 후(後)규제라는 방식은 반복되고, 그사이 시민의 권리는 침해당하거나 기업의 독점 구조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기술통제와 윤리 시스템, 사전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이제는 기술도 리스크로부터 관리해야 할 대상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중점 검토하길 요청드립니다.
국가기술윤리위원회 설치
신기술의 사회적 파장, 윤리 문제, 차별 위험성 등을 사전 심의하고 조정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합니다. 기술중립성과 인간중심 철학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입니다.선제적 기술영향평가제도 법제화
신기술 도입 시 ‘환경영향평가’처럼 기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윤리, 노동, 정보 안전 측면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를 법으로 명시해야 합니다.AI·로봇·생명과학 등 고위험 기술 통제지침 마련
특정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등록제·신고제·시민참여형 감시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무분별한 기술 상용화를 제어해야 합니다.
기술혁신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하지만 통제 없는 속도는 사고를 낳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통제의 프레임을 짜야 합니다. '기술 주권'은 기술을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위험을 감당할 줄 아는 체계로부터 시작됩니다.
협조뉴스는 묻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제어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기술윤리와 사회적 통제는 혁신을 늦추는 걸림돌일까요, 아니면 안전장치일까요?
‘기술 독재’가 아닌 ‘기술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다음 제6회는 『교육 분야의 리스크관리』를 주제로 이어갑니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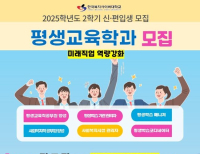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학과 신·편입생 모집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학과 신·편입생 모집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경북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개교 4주년 기념 이벤트 실시
경북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개교 4주년 기념 이벤트 실시
 영주선비도서관, ‘생애 첫 책 꾸러미’ 배부 시작
영주선비도서관, ‘생애 첫 책 꾸러미’ 배부 시작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